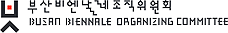Busan Biennale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와 1987년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연환경미술제인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의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1998년에 통합되어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로 출범한 이후, 격년제 국제현대미술전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부산비엔날레는 정치적인 논리 혹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미술인들의 순수한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술인들이 보여 주었던 부산문화에 대한 지역적 고민과 실험성 등은 오늘날까지도 부산비엔날레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대미술전, 조각심포지엄, 바다미술제의 3가지 행사가 합쳐진 경우는 부산비엔날레가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또한 행사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네트워크는 국내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확장시킴과 동시에 글로벌한 문화적 소통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동으로부터 39년째에 접어든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대중화, 즉 일상 속의 예술 실현을 목표로 하여 실험적인 현대미술 교류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 2000
조회 16,446
관리자 2018-08-20 20:10
<2000>,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8, 갤러리 코우(베를린), 작가 제공
헨리케 나우만
2000
동독에 있는 츠비카우 마을에서 자란 나우만은 독일 통일 이후 1990년대 극우파 이데올로기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지배적인 문화로 번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이후 츠비카우는 2000년대 이민자 혐오에서 비롯한 연쇄 살인을 비밀리에 저지른 신나치주의 테러단체 NSU의 은신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나우만의 설치 작품 〈2000〉(2018)은 이와 같은 근역사의 전개 양상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준다. 작가는 그 방법으로서 실내 디자인이 어떠한 양상으로 한 세대의 좌절된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 이 작품은 여러 개의 가구가 커다란 회색 카펫 위에 놓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령 이중에서 〈독일 통일을 애도하는 제단〉(2018)의 경우, 체리 나무 베니어판으로 만들어진 거실용 장식장은 무덤의 형상을 하고 있고, 인조 소가죽으로 만든 두 개의 장례 화환이 그 앞에 기대어져 있다. 카펫은 한 때 분리되어 있던 독일의 모습을 본 딴 형태다. 통일 이후 동독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새로운 자유를 선사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 장악당했다. 사회주의 시대에 썼던 낡은 가구가 모두 이케아 혹은 포스트모던한 멤피스 디자인을 모방한 다른 브랜드의 가구로 대체된 것이 그 변화를 보여준다. 어째서 어떤 젊은이는 엑스터시 같은 약물과 테크노에 빠지고 다른 이는 신나치주의자나 급진적인 이슬람주의 신봉자가 되는 것일까? 나우만은 사운드, 이미지, 오브제를 사용한 일종의 포스트 초현실주의 콜라주 스타일로 그 변화의 과정을 추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