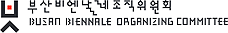Busan Biennale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와 1987년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연환경미술제인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의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1998년에 통합되어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로 출범한 이후, 격년제 국제현대미술전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부산비엔날레는 정치적인 논리 혹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미술인들의 순수한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술인들이 보여 주었던 부산문화에 대한 지역적 고민과 실험성 등은 오늘날까지도 부산비엔날레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대미술전, 조각심포지엄, 바다미술제의 3가지 행사가 합쳐진 경우는 부산비엔날레가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또한 행사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네트워크는 국내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확장시킴과 동시에 글로벌한 문화적 소통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동으로부터 39년째에 접어든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대중화, 즉 일상 속의 예술 실현을 목표로 하여 실험적인 현대미술 교류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제프 스트라우
조회 2,506
관리자 2020-09-03 22:54

1957년 오스트리아 빈 출생
현재 베를린 거주
요제프 스트라우, 〈나는 새를 만들고자 했다〉, 2020, 흙, 조명, 메탈, A2 포스터 외, 가변크기
Josef STRAU, I tried to make birds, 2020, Sand, lampshade, paint on restored metal, A2 poster, variable dimensions
베를린을 무대로 활동하는 작가 요제프 스트라우는 2006년에 에세이 「비생산적 태도」를 출판했다. 현재 컬트 아트 도서로 구분되는 이 책은 작품 생산과 전시를 부정하는 예술적 모델에 대해 논의한다. 사변적 자동-이론적 설명을 선호하면서 이미지 제작을 부정하는 인습타파주의적인 접근법은 스트라우 작품의 표식이다. 그의 예술적 실천뿐만 아니라 비평과 큐레이토리얼 작업에서도 이러한 예술적 목적을 향한 의심은 존재한다. 이러한 원칙으로 스트라우는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 목재, 골판지, 철망, 와이어와 같은 평범한 재료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건축적 버팀목으로서 텍스트 배열에서의 공간의 윤곽을 그려내거나 때로는 회화를 하얗게 지워낸다. 중고 전등갓은 이것을 완성한다. 미학적 아름다움이 없이 완성되는 설치는 반대되는 두 힘이 작용하고 있는 불안정한 경험을 선사하기도 한다. 다변적인 그의 텍스트는 유사-자전적이고 순환적인 기억을 표현하며, 일화적인 설명과 비판적인 관찰을 결합하는 반면 의심과 폭로를 분명히 드러낸다.
두서없이 진행되는 내러티브는 스트라우의 목소리와 종이의 침묵을 위한 넓은 공간을 만들어낸다.
발터 벤야민은 ‘사유이미지’를 가장 높은 형태의 비판으로 보았다. 스트라우는 텍스트의 최대치를 생산한 원래의 ‘사유이미지’를 반전시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텍스트는 이미지가 된다. 볼 수 없고 얻을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이미지인 것 말이다. 벤야민과 같이 스트라우는 일종의 신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따른다. 작가의 성상 파괴적 접근방식과 그의 ‘이교적’ 접근법(모두 작가 사용)은 이미지의 순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구원을 추구한다. 그의 설치는 어둡고,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종류의 조명을 만들어 내어 관람자의 지각을 자극한다. 스트라우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해는 자아의 스펙트럼 분열로 이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