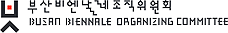Busan Biennale
부산비엔날레는 1981년 지역 작가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비엔날레인 부산청년비엔날레와 1987년에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자연환경미술제인 부산국제바다미술제, 그리고 1991년의 부산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이 1998년에 통합되어 부산국제아트페스티벌(PICAF)로 출범한 이후, 격년제 국제현대미술전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부산비엔날레는 정치적인 논리 혹은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산 지역미술인들의 순수한 의지와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미술인들이 보여 주었던 부산문화에 대한 지역적 고민과 실험성 등은 오늘날까지도 부산비엔날레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현대미술전, 조각심포지엄, 바다미술제의 3가지 행사가 합쳐진 경우는 부산비엔날레가 전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또한 행사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네트워크는 국내 미술을 해외에 소개하고 확장시킴과 동시에 글로벌한 문화적 소통으로서 지역문화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태동으로부터 39년째에 접어든 부산비엔날레는 현대미술의 대중화, 즉 일상 속의 예술 실현을 목표로 하여 실험적인 현대미술 교류의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박해남)
조회 696
관리자 2022-12-15 15:18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한국전쟁 이후 부산에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다. 그들 중 일부는 거리를 부랑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지역 언론은 이들을 사회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1960년대 초 부산시는 민간 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장림동 영화숙과 재생원에 부랑인을 수용했으나, 인권 유린 및 회계 부정으로 1971년 계약을 취소했다. 이때 형제육아원을 운영하던 박인근은 고아원에서 부랑인 시설로 업종을 변경한다. 그리고 1975년 부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주례동에 전국 최대의 부랑인 시설을 만든다. ‘사회정화’를 전면에 내세운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자 형제복지원은 전국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영화 〈종점 손님들〉(1981), 드라마 〈탄생〉(1982) 등이 대표적이었다.
형제복지원 내부에서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었다. 경찰 및 부산시와의 공모 속에서 부랑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약자들을 강제로 수용했고, 폭력과 강제 노역을 통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도모하였다. 알려진 사망자만 657명이었고, 살아남아 시설을 나온 이들도 트라우마와 질병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형제복지원의 참상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사회를 정화하라는 국가의 요구와 부랑인을 분리해 달라는 지역사회의 요구 등 다양한 이들의 공모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과와 배상, 지역사회의 기억과 성찰 등의 과제가 남았다.